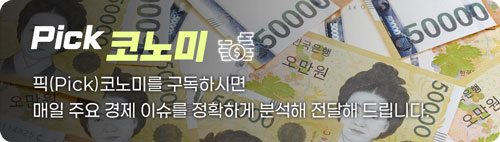통계청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한우 비육우 마리당 161만 4000원 손해
3년째 적자···공급 과잉에 경락가격 하락
한우 비육우 마리당 161만 4000원 손해
3년째 적자···공급 과잉에 경락가격 하락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이 높은 반면 농가에서는 소를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비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농가의 손실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61만 4000원으로 1년 전(142만 6000원)보다 18만 8000원(13.2%) 증가했다. 한우 비육우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얻는 총수입은 평균 845만 2000원인데 사육비가 1006만 6000원이 들어 마리당 161만 4000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우 비육우의 마리당 순손실은 △2022년(68만 9000원) △2023년(142만 6000원) 등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순손실이 증가한 데에는 경락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00㎏당 12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1만 4000원) 감소했다. 그러나 한우 비육우 경락가격이 하락한 데 따라 마리당 순손실은 13.2% 더 늘었다. 지난해 경락가격은 1㎏ 당 1만 7963원으로 전년(1만 8619원) 대비 3.5% 감소했다.
경락가격 하락은 누적된 공급 과잉 탓이 크다. 한우의 공급 과잉 우려는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우 수요가 늘며 한우 가격이 상승하고 사육 두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 296만 2000마리였던 사육두수는 2022년 355만 7000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3월 한우 사육 마릿수도 326만 마리로 전망했다. 농경연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 수준인 만큼 여전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급 과잉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공급 조절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미국·호주 등에서는 18개월 기른 소고기를 많이 먹지만 국내에서는 30개월 가량 키운 소고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사육두수 증가분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2년 6개월 가량 발생해 즉각적인 공급 조정이 힘들다. 게다가 한우 가격 급등기에 자율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경연은 올해 3월 축산관측을 통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하지만 공급 과잉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올해 한우 수급 단계를 ‘심각·경계’ 수준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낮은 도매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 수급 안정을 위해 사육규모 조절 사업 시행 및 한우 소비촉진 사업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매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한우 소비자가격의 절반 가량이 유통비용인 만큼 도축, 가공, 운반 등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내놓은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유통비용률은 52.6%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만 원의 소고기를 샀을 때 그중 유통비용이 5260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한우 유통비용률은 2019~2021년 48%대를 기록했으나 2022년 53%대로 상승한 바 있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우 ‘1+’ 등급 도매가는 1㎏에 1만 5633원으로 전주(1만 7350원)에 비해 9.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한우 가격은 ‘1+’ 등급 안심을 기준으로 100g 당 1만 2709원에서 1만 2853원으로 1.1% 올랐다. 양지와 갈비 등 다른 부위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의 순손실은 111만 5000원으로 전년(127만 6000원)보다 16만 1000원 개선됐다. 육우 생산비 또한 지난해 180만 8000원 적자를 봤지만 전년보다는 21만 2000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젖소는 마리당 215만 원, 비육돈은 3만 2000원의 순수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