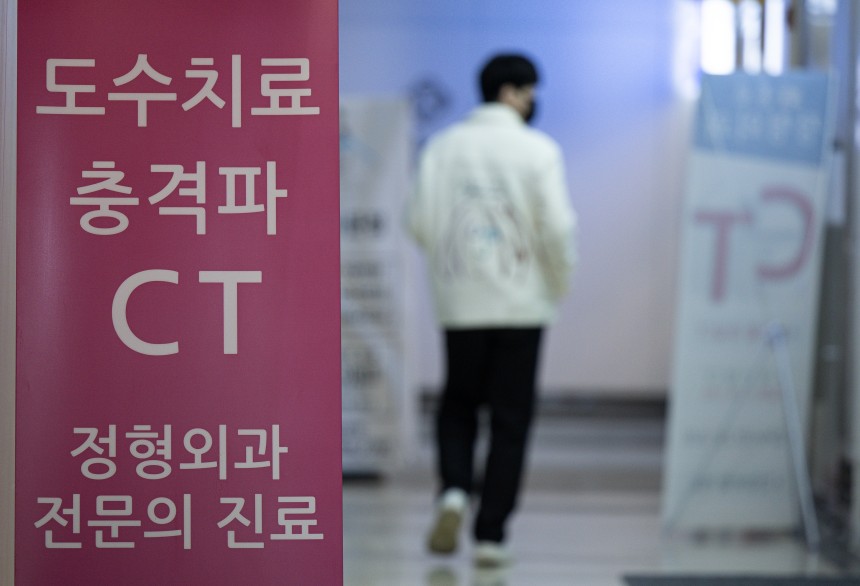‘도수치료 보험금’ 핵심은 횟수 아닌 효과 입증
효과 입증하려면 X-ray나 MRI 등 검사 기록 중요
A씨는 목·어깨·척추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다 경추통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년 동안 주 2회씩, 100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진행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가 증상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반면 부정확한 자세로 인해 목뼈원판 장애 진단을 받은 B씨는 6개월 동안 40회의 도수치료를 받고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는 A씨 때처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조사했으나, 도수치료가 B씨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보험사와 고객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과잉진료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수치료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반면, 고객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고객 대다수는 도수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과잉진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받은 경우라면, 도수치료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보험금 청구 심사의 쟁점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효과 입증을 위해선 엑스레이(X-ray)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같은 영상 검사나 관절가동검사(ROM), 도수근력검사(MMT)와 같은 기록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해진다.
A씨와 B씨의 차이도 도수치료 횟수가 아니라, 치료효과 입증이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의사 면담 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진료기록부에도 통증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통증 척도(VAS) 점수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었다. 언제 어떤 부위에 도수치료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어서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험사는 A씨가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악화와 회복이 반복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수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도수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틈틈이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찍었고, 이를 토대로 치료 계획 등을 세웠다.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어 보험사는 도수치료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최초 10회를 보장하되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이나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결국 도수치료를 받고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호전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2016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당시 금감원은 2015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경추통으로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사례에 대해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공개하며 “그동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도수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을 때는 의사의 직접 진료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며 “치료의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하면서 도수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효과 입증하려면 X-ray나 MRI 등 검사 기록 중요
일러스트=챗GPT 달리3
A씨는 목·어깨·척추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다 경추통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년 동안 주 2회씩, 100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진행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가 증상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반면 부정확한 자세로 인해 목뼈원판 장애 진단을 받은 B씨는 6개월 동안 40회의 도수치료를 받고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는 A씨 때처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조사했으나, 도수치료가 B씨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보험사와 고객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과잉진료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수치료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반면, 고객은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고객 대다수는 도수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과잉진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받은 경우라면, 도수치료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보험금 청구 심사의 쟁점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효과 입증을 위해선 엑스레이(X-ray)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같은 영상 검사나 관절가동검사(ROM), 도수근력검사(MMT)와 같은 기록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해진다.
A씨와 B씨의 차이도 도수치료 횟수가 아니라, 치료효과 입증이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의사 면담 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진료기록부에도 통증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통증 척도(VAS) 점수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었다. 언제 어떤 부위에 도수치료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어서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험사는 A씨가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악화와 회복이 반복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수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도수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틈틈이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찍었고, 이를 토대로 치료 계획 등을 세웠다.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어 보험사는 도수치료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뉴스1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최초 10회를 보장하되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이나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결국 도수치료를 받고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호전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2016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당시 금감원은 2015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경추통으로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사례에 대해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공개하며 “그동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도수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을 때는 의사의 직접 진료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며 “치료의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하면서 도수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