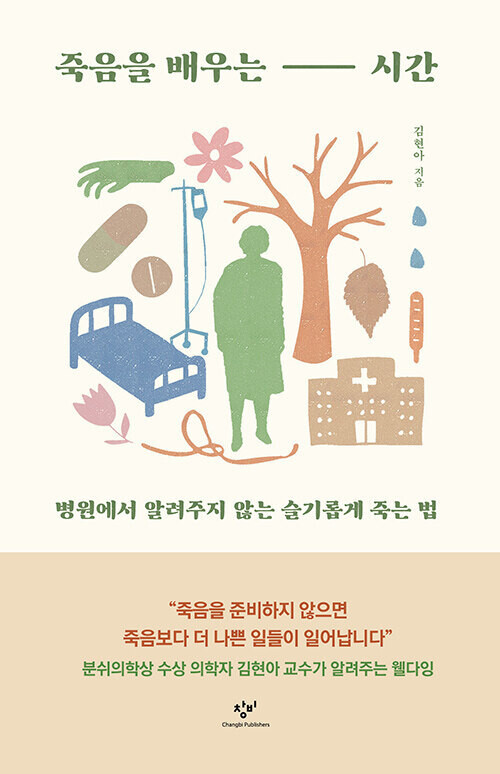김희경의 에이징북
‘죽음 대비’ 했지만 잘 죽기 어려운 사회
노화·죽음 질병 취급하는 문화 바꿔야
‘죽음 대비’ 했지만 잘 죽기 어려운 사회
노화·죽음 질병 취급하는 문화 바꿔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만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꽂은 채 목숨이 연장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노화와 죽음을 질병으로 보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언장을 쓰고 있다.
최근 공동 저자로 참여한 ‘우리, 나이 드는 존재’가 출간됐는데, 함께 글을 쓴 저자 중 한명은 해마다 유언장을 고쳐 쓰며 ‘새롭게 죽을 결심’을 한다고 했다. 그 말이 꽂혀 나도 따라 해 보는 중이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그 저자처럼 사전 장례식의 모양새를 상상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떠올리는 일, 내가 죽은 뒤 주검과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언장에 정리하는 일 모두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다. 유언장은 사후를 위한 것이니 꼭 써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죽음을 상상하다 보니 자꾸 그 지점에서 멈칫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죽는다. 나는 그러기 싫은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이 막혀 유언장 작성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의 기초적인 준비는 해두었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마쳤고, 등록증 두개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 김현아가 쓴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읽고 나니, 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화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죽음을 배우는 시간’에 기대어 내 미래를 상상해본다. 별 탈 없이 계속 살아 고령 노인이 된다면 언젠가는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단계가 올 거고, 밥을 잘 먹지 못하다가 흡인성 폐렴에 걸릴지 모른다.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으로 나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해서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온갖 관이 주렁주렁 달리고, 인공호흡기가….
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법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다. 말기와 임종기를 의사들도 나누기 어렵다는데 나와 보호자가 무슨 수로 알겠는가. 고소를 두려워하는 의사들은 임종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게다가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모든 병원에 있지도 않고 요양병원에는 거의 없다. 어찌어찌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치자.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영양과 수분 공급은 법률상 연명의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에 있는 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강제로 ‘콧줄’을 꽂아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서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고, 죽음의 준비에는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더 가지 않겠다는 결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병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죽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밖에서 죽음을 맞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열이 펄펄 끓고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을 집에 두고 지켜볼 보호자가 얼마나 될까.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있으려나. 일본처럼 마을마다 24시간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우리에겐 그런 인프라가 없다. 내년에 마을에서 의료·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법이 시행된다지만, 지금도 시범사업 중 의료 연계가 가장 어렵다는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게다가 연명의료 없이 통증을 관리해줄 완화의료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저래 잘 늙고 잘 죽기 어려운 사회다. 이러니 다들 ‘차라리 돌연사’를 꿈꾸거나 ‘스위스 타령’을 한다. 국민의 76%가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하지만, 나는 자살률이 높고 완화의료가 척박한 환경에서 조력사망은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죽음과 노화를 질병 취급하는 문화다. 저자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듯한 착시 효과가 생기면서, 노화에 의한 자연사라는 만고의 진리가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과거 조상들이 생의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맞던 일은 이제 심하게는 비난받게 되고, 하다못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수액이라도 맞다가 죽어야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는 것이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노화와 함께 시름시름 잔병이 찾아오고 기능은 점점 더 쇠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시간을 거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늙기 전에 사망하지 않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늙어서 진단받았다면 “암도 노환”이다.
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그 말을 떠올리며 여러 계획을 적어보았다. 이를테면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겠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겠다,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 집중 치료는 받지 않겠다, 고통은 싫으니 통증 관리만 받겠다… 등등의 계획을 끼적이다 멈칫했다. 이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인지장애가 먼저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책도 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유언장을 다 쓰지 못했다. 대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의료돌봄계획서’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를 기록해두면, 그 결정을 누군가 대신 해야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챗지피티(GPT)와 대화하며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다. 올해는 유언장과 의료돌봄계획서를 함께 써볼 참이다. 두 문서를 해마다 고쳐 쓰며, 죽음을 삶에서 밀어내지 않고 조금씩 친해지는 연습을 해 보려 한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죽음을 배우는 시간 l 김현아 지음, 창비(2020)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